오늘로서 아쉬운 가을도 끝나고 내일(12월 7일)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내일은 바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중 입동이다.

입동(立冬)은 상강과 소설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음력 10월 중이며, 양력으로는 11월 7일이나 8일 무렵이다. 겨울의 6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태양의 황경이 225°이며,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다. '입동'이라는 말은 '겨울(冬)이 들어서다(立)'라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사립’(四立: 立春, 立夏, 立秋, 立冬)은 사계절의 시작이며, ‘兩分’(양분: 春分, 秋分)과 ‘兩至’(양지: 夏至, 冬至)는 사계절의 중간이 된다.

중국의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기원전 475~221),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945),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1281) 등 여러 문헌에서 입동 기간을 5일 단위로 3후로 구분하는데, 첫 5일간인 초후(初候)에는 “一候水始冰”(일후수시빙)이라 하여 물이 얼기 시작하고, 다음 5일간인 중후(中候)에는 “二候地始凍”(이후지시동)이라 하여 땅이 얼기 시작하며, 마지막 5일간인 말후(末候)에는 “三候雉入大水為蜃”(삼후치입대수위신)이라 하여 꿩이 큰물에 들어가 대합조개가 된다(꿩은 드물어지고 꿩의 무늬 같은 조개가 많이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농사로 이야기하면 “春耕夏耘, 秋收冬藏”(춘경하운, 추수동장: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 매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이라고 하듯, 한해의 수확을 향유하는 때이기도 하다.

입동 즈음에는 동면하는 동물들이 땅 속에 굴을 파고 숨으며, 산야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풀들은 말라간다. 『회남자(淮南子)』권3 「천문훈(天文訓)」에 의하면 “추분(秋分)이 지나고 46일 후면 입동(立冬)인데 초목이 다 죽는다.”라고 하였다. 낙엽이 지는 데에는 나무들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자연의 이치가 숨었다.

[입동 관련 풍속]
마을마다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집안 곳곳에 놓으며, 이웃은 물론 농사에 힘쓴 소에게도 나누어주면서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제사를 올린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이날을 기준으로 김장준비를 한다.
이 즈음 단풍도 저물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무들이 헐벗기 시작한다.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기 시작한다.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요즈음은 김장철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농가에서는 냉해(冷害)를 줄이기 위해 수확한 무를 땅에 구덕(구덩이)을 파고 저장하기도 한다. 입동철에는 김장 말고도 무말랭이, 시래기 말리기, 곶감 만들기, 땔감으로 쓸 장작 패기, 창문 바르기 같은 일로 겨울채비에 바빴습니다. 솜을 두둑이 넣어 누비옷을 만들고 솜을 틀어 두툼한 이불도 마련해야 했다. 추수하면서 들판에 놓아두었던 볏짚을 모아 겨우내 소의 먹이로 쓸 준비도 한다. 예전에는 겨울철에 풀이 말라 다른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볏짚을 썰어 쇠죽을 쑤어 소에게 먹였다.

입동을 즈음하여 예전에는 농가에서 고사를 많이 지냈다. 대개 음력으로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날을 받아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하고, 제물을 약간 장만하여 곡물을 저장하는 곳간과 마루 그리고 소를 기르는 외양간에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고 나면 농사철에 애를 쓴 소에게 고사 음식을 가져다주며 이웃들 간에 나누어 먹었다.
입동에는 치계미(雉鷄米)라고 하는 미풍양속도 있었다. 여러 지역의 향약(鄕約)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계절별로 마을에서 자발적인 양로 잔치를 벌였는데, 특히 입동(立冬), 동지(冬至), 제석(除夕)날에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을 치계미라 하였다. 본래 치계미란 사또의 밥상에 올릴 반찬값으로 받는 뇌물을 뜻하였는데, 마치 마을의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기인한 풍속인 듯하다. 마을에서 아무리 살림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년에 한 차례 이상은 치계미를 위해 출연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랑탕 잔치로 대신했다. 입동 무렵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는데 이때 도랑을 파면 누렇게 살이 찐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 이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을 도랑탕 잔치라고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10월부터 정월까지의 풍속으로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임금에게 우유를 만들어 바치고, 기로소(耆老所)에서도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겨울철 궁중의 양로(養老) 풍속이 민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입동을 즈음하여 점치는 풍속이 여러 지역에 전해오는데, 이를 ‘입동보기’라고 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속담으로 “입동 전 가위보리”라는 말이 전해온다. 입춘 때 보리를 뽑아 뿌리가 세 개이면 보리 풍년이 든다고 점치는데, 입동 때는 뿌리 대신 잎을 보고 점친다. 입동 전에 보리의 잎이 가위처럼 두 개가 나야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믿어지고 있다. 또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입동에 갈가마귀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특히 경남 밀양 지역에서는 갈가마귀의 흰 뱃바닥이 보이면 이듬해 목화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점친다.
이러한 농사점과 더불어 입동에는 날씨점을 치기도 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입동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입동 때의 날씨를 보아 그해 겨울 추위를 가늠하기도 한다. 대개 전국적으로 입동에 날씨가 추우면 그해 겨울이 크게 추울 것이라고 믿는다.

[입동 관련 속담]
9월 입동 오나락이 좋고 10월 입동 늦나락이 좋다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
立冬那天冷, 一年冷氣多.(입동나천랭, 일년냉기다)(北方): 입동날 날씨가 차면 한 해 찬 기운이 많다.
立冬晴, 一冬晴. 立冬雨, 一冬雨.(입동청, 일동청. 입동우, 일동우)(客家족): 입동에 맑으면 겨울 내내 맑고, 입동에 비오면 겨울 내내 비온다.
立冬有風, 立春有雨. 冬至有風, 夏至有雨.(입동유풍, 입춘유우. 동지유풍, 하지유우)(山西): 입동에 바람이 많이 불면 입춘에 비가 내리고, 동지에 바람이 많이 불면 하지에 비가 내린다.

[입동 관련 중국 한시]
《立冬》 입동
【明】王稚登(왕치등)
秋風吹盡舊庭柯,(추풍취진구정가) 가을바람은 옛집 마당의 나무로 다 불어오고
黃葉丹楓客里過.(황엽단풍객리과) 울긋불긋 단풍잎 속 나그네 신세의 하룻밤
一點禪燈半輪月,(일점선등반륜월) 방안에는 등잔불 하나 창 밖에는 반달
今宵寒較昨宵多.(금소한교작소다) 오늘밤 추위는 어젯밤보다 더하네
- 禪燈(선등): 원래 절의 등불이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등잔불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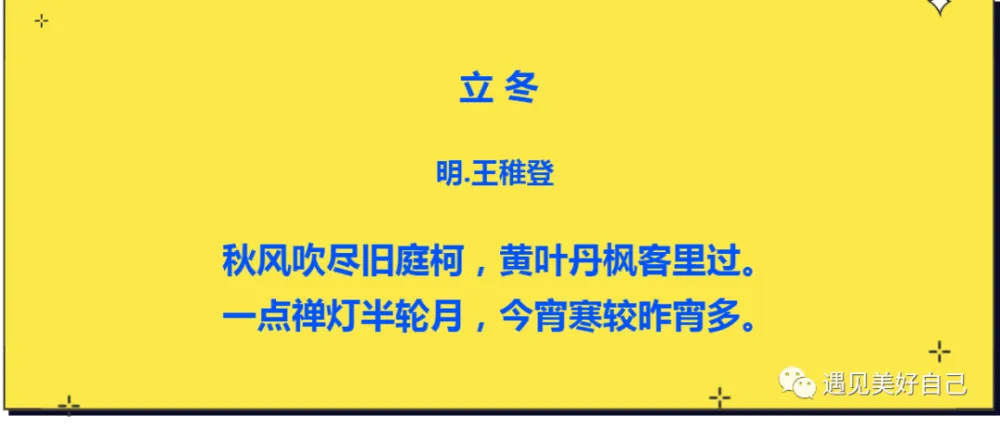
[작가]
王穉登(왕치등1535-1612): 자(字)는 伯谷(백곡)이고 호(號)는 松壇道士(송단도사)이며, 蘇州(소주)의 長洲(장주)(지금의 장쑤성 쑤저우 江蘇省蘇州) 사람이다. 명(明)나라 후기 문학가이자 서법가(書法家)이다. 嘉靖(가정) 연간에 북경으로 유학와서 당시 대학사였던 袁煒(원위)의 집에 거주하였다. 萬歷(만력) 22년에 與陸弼(육필), 魏學禮(위학례) 등과 조정에 불리어 가 국사(國史)를 편수하였다. 저서로는 《吳社編》(오사편), 《弈史》(혁사), 《吳郡丹青誌》(오군단청지) 등의 작품이 있다. 서법에 뛰어났는데, 행서, 초서, 전서, 예서 등을 모두 잘 썼다. 유명한 《黃浦夜泊》(황포야박)이 전해온다. 「公安派」(공안파)의 대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袁宏道(원굉도)는 그의 시문에 대해 “위로는 마힐 왕유와 비유되고, 아래로는 저광희와 유장경에 뒤지지 않는다.”(上比摩詰(王維),下亦不失儲(光羲)、劉(長卿).“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감상]
가을 겨울의 분기점인 입동을 맞아, 나그네 신세로 한 객사에 묵고 있는데 바람조차도 가을바람은 이제 마지막이란 듯 모두 다 쏟아내듯 나뭇가지로 불어닥치는 밤, 가을을 아쉬워하는 남은 단풍잎, 방안에는 외로운 등잔불 하나, 창문 밖으로는 자신의 신세처럼 고독해 보이는 반달 하나 하늘에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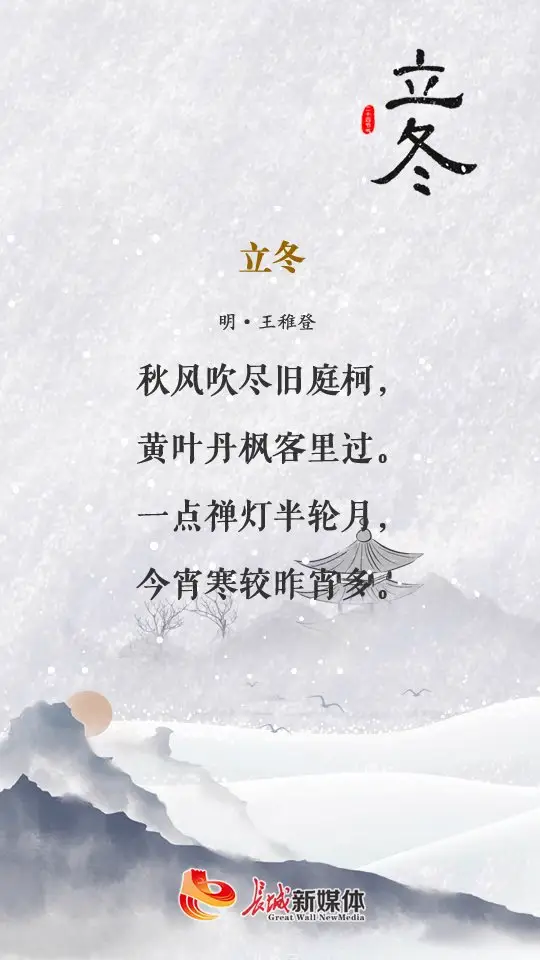
[입동 관련 우리나라 시]
입동(立冬)/박종영
기나긴 밤 못다 한
뒷이야기가 반짝거리는
따스한 아랫목,
뒤란 대숲 이는 바람에도
달빛 스치는 소리
장지문에 귀 솔깃하고,
장독대 오동잎 한 개
툭,
부서지는 비명으로
겨울 시작이다.

운문사/이동순
운문사 비구니들이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
메주를 빚고 있다
입동 무렵
콩더미에선 더운 김이 피어오르고
비구니들은 그저
묵묵히 메주덩이만 빚는다
살아온 날들의 덧없었던 내용처럼
모두 똑같은 메주를
툇마루에 가지런히 널어 말리는
어린 비구니
초겨울 운문사 햇살은
그녀의 두 볼을 발그레 물들이고
서산 낙조로 저물었다

여름이면 폭염, 폭우, 태풍에 대한 걱정이고, 겨울이면 한파, 폭설이 걱정인데, 이번 겨울 추위는 또 어떨지 미리 걱정이 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면 너무 오버인가.
인간이 빚어내는 뜻밖의 대형 사건사고도 많은데다 자연도 예기치 못하는 이변을 곧잘 연출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겨울을 맞으면서 추위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다지면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듯 바짝 엎드린 채 무사히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위가 가니 추위가 오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4절기] 대설(大雪): 본격적인 눈의 계절 겨울 속으로 (0) | 2022.12.06 |
|---|---|
| [24절기] 소설(小雪):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 굿바이 가을 (1) | 2022.11.21 |
| [24절기] 상강(霜降): 서리 내리고 조락(凋落)의 계절로 접어들다 (0) | 2022.10.21 |
| [24절기] 한로(寒露): 이슬도 차가와지는 깊어가는 가을 (1) | 2022.10.07 |
| 【24절기】추분(秋分): 음과 양, 낮과 밤의 균형점 (2) | 2022.09.22 |



